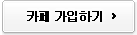자유게시판
성과주의에 대한 오해 (LG경제연구소) |
|
|---|---|
| 글쓴이 관리자 2006.11.02 00:00 | 조회수 2391 0 스크랩 0 |
|
우리청 성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많은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 인사 제도의 기대 효과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적절한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쉽게 오해하거나 혼동할만한 성과주의 인사의 요소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가 다가오고 있다. 스토브리그에서는 한 해 성적을 바탕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많은 야구팬들의 이목이 이승엽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 홈런 신기록을 세운 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거나 또는 국내에 잔류하게 될 때까지 받게 될 연봉 액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프로야구에 스토브리그가 다가온다면, 기업에는 평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게 되고, 이 결과는 구성원 개인의 연봉이나 연말 성과급에 직결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평가 기간이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특히 성과주의 보상 제도가 확산되면서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받는 보상 금액이 다르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직급이 낮더라도 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조직 내부에 미묘한 긴장감마저 돌 정도이다.
성과주의 hr에 대한 6가지 오해
우리 기업들에 있어 성과주의 보상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imf 위기를 경험한 후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을 활발하게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hr(human resource) 분야에서는 특히 성과주의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성과주의로의 인사 제도 변화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제도나 조직 문화와의 마찰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情)’과 ‘인간’ 중심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한국 문화에서 ‘시스템’과 ‘개인’ 성향이 강한 미국식 성과주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과주의 hr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성과주의를 되짚어보고, 성과주의 hr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나 혼동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시스템 도입이 성과주의 hr의 시작이다
성과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인사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예로 핵심 인재의 채용, 구성원간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보상 차등 시스템, 성과 부진자들에 대한 구조 조정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구성원에게 성과주의 마인드를 확고하게 심어주고, 구성원들을 조직이 원하는 대로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성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일본의 fujitsu는 1993년 대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구성원들, 장기적인 성과 제고 관점의 부재, 구성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만 등 성과주의 hr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주의의 역효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고, 성과주의 도입을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그리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조직 말단까지 침투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던 성과주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성과주의에 대한 명확한 철학, 구성원들이 이해나 기업 문화 등 변화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단순한 인사 시스템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에게 보상 철학 및 제도 변경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변화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주의 문화 형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fujitsu가 그들의 성과주의와 관련한 문제점을 ‘형태만 만들고 혼을 물어넣지 않았다’라고 자책한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보상 시스템이 성과주의의 핵심이다
많은 기업들이 성과주의 hr의 핵심은 보상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고 성과자는 많은 보상을 받는 반면, 저 성과자는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이 성과주의 hr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구성원 보상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가 성과주의 hr의 한 요소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성원의 보상을 차별한다고 해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맞춤 신사복 업계의 최대 할인 유통업체인 men’s wearhouse는 1995년에서 1999년동안 매출이 연간 26%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은 29% 증가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과 향상 비결은 바로 구성원 교육에 있었다고 한다. 많은 인센티브나 구성원간 차별적 보상 시스템보다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한 것이다 미국의 hr 컨설팅 회사인 towersperrin에 의하면 성과는 구성원의 태도와 열정, 그리고 역량과 함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량이 강한 구성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업무의 자율성 및 업무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wal-mart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 매출 감소를 예상하여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실행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성원의 동기 부여, 전략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적절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구성원들의 보상 차별화나 많은 인센티브만으로 성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보상은 성과 향상의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보상 자체가 성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자율적 업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성과 향상을 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 조직 몰입도를 높인다
인재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핵심 인재에 대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그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높은 보상 금액이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그들의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보유에 효과적일 뿐, 장기적으로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0년 mckinsey의 인재 전쟁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자들의 근속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의 축적(36%), 고 성과에 대한 추가적 보상(31%) 등 금전적 보상 관련 요인보다도 재미 있고 도전적인 일(59%), 내가 열정을 가진 일(45%), 상사와의 돈독한 관계(43%), 경력 개발의 기회(37%) 등 업무 만족감이나 조직 내의 인간관계, 발전 기회 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fredrick herzberg 박사도 구성원의 업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급여와 같은 금전적 보상 요소보다 성취감, 인정, 업무자체, 책임감 등 비금전적 보상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들은 성과주의 보상 제도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해서 구성원의 조직 몰입이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sas institute의 인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david russo 역시 “보수를 높여준다고 해도 그 효과는 한 달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한달 후에는 인상된 봉급에 이미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초창기 시절, apple computer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80 내지 90시간씩 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일 자체가 재미있고 도전적이었으며, 그들이 스스로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기업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능한 구성원의 조직 몰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금전적 보상 외에 업무의 즐거움, 성취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 비금전적 보상이 동시에 제공될 때,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개인별 차등이 중요하다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는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 차등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최근 핵심 인재들에게 걸맞는 보상 방안이 강구되면서 조직 내에서의 개인 차등화 방안을 더욱 확산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개인 차등 보상은 개인의 성과 제고에 강한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보상의 내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인 차등화가 오히려 성과주의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팀웍이 중시되는 업무라든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기업에서 무리한 개인 차등화를 시도한다면 구성원간의 위화감만 팽배시키게 된다. 실제로 강한 가족주의 문화와 fun 경영을 통해 널리 알려진 southwest airlines는 경영진들에게도 개인별 인센티브제 보다는 이윤 분배 제도와 주식 공유제 등을 통해 전체 조직 성공 여하에 따른 집단 보상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 차등화로 인해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 수준의 성과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다. joiner associates의 선임 경영 컨설턴트인 peter r. scholtes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성과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아무도 집단성과 제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력 생산 업체인 aes는 일정 부분의 보상은 개인별 성과에 기초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전체 조직이나 소속부서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continental airlines는 ‘정시 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해당 월에 65달러를 전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기능간 장벽을 넘어서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continental airlines는 96년부터 자사가 항공업계 3위 안에 들 때 65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절해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팀 성과급이나 집단 이익 배분제와 같은 집단 성과급 도입 추세는 개인 이데올로기가 강한 미국 기업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집단성과에 의한 차등이나 개인성과에 의한 차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과주의를 강화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별 차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 전체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보상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 차등 폭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성과주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보상의 차등 폭이 클수록 좋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확산되는?하느니만 못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왕 차별할 것이면 큰 폭으로 차별하여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폭의 보상 차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notre dame 대학의 matt bloom 교수는 미국 메이저 리그의 한 야구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봉 차등 폭이 클수록 팀 승률은 더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팀웍이 중시되는 업무나 문화에서는 무조건 보상 차등 폭이 크다고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fujitsu도 큰 폭의 보상 차별화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다. 1993년 성과주의를 도입한 fujitsu는 일을 잘하는 슈퍼 사원인 ‘high-performer’ 배출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전 사원의 10%에 해당하는 sa급 사원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한 fujitsu는 그들에게 많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과감하게 급여 격차를 둔 점 때문에 sa급 사원은 sa급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높은 수준의 우수 사원들이 장기적인 조직의 성공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만 역점을 두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보상 차등 폭에 대한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상 폭을 크게 한다고 해서 성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조직마다 업무 스타일이나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의 적정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차등 폭을 적게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원에게 적절한 동기 부여로 작용 하고 구성원들의 팀웍을 높일 수 있다면, 차등 폭을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 성과주의는 엄격하고 냉정하다
성과주의라는 어감에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고, 냉정함이 묻어 있는 듯 여겨진다. 그래서 마치 매년 개인의 성과 평가를 통해 하위 10%의 c-px-layer를 가려내는 ge같은 기업들이 성과주의 문화가 강한 회사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 실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ge가 시장 중심형 문화를 통해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southwest airlines나 toyota는 가족 중심적 문화를 통해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즉, southwest airlines는 고능률의 인간관계 구축을 중시하고, 기능 간 장벽을 없애고, 어느 한 개인이나 팀이 아닌 관련 부서의 공동 문제 해결, 업무 기능간의 팀웍 강화를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southwest airline와 비슷한 문화 형태를 보이는 toyota도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top-down식의 강압적 개혁보다 bottom-up식의 구성원 참여와 자기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연공서열 중심 문화에 맞는 성과주의를 정착시켰다. 특히 fujitsu가 무리하게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실패한 점을 거울삼아, 일할 의욕의 고취, 신뢰 문화 기반, 업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능력과 노력 기반의 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ge형의 시장 중심 성과주의가 반드시 성과주의의 best practice가 아닐 수도 있다. 자사 기업 운영 철학과 조직 문화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표 의식과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southwest airlines나 sas institute, cisco systems 등 성과를 중시하고 실제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기업의 목표 의식이 명확하고 이를 전 구성원과 공유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중요성,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결국 성과주의 hr은 ‘성과’를 통해 구성원을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조로써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