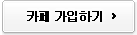| |
| |
| |
세종시 부실 시공 아파트 등 현장 관리 비상 걸려
부적합 철강재 사용도 관리 대상 포함…고부가가치
건설산업은 건축, 토목, 플랜트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철강재를 시공하면서 철강산업과 가장 유대가 깊은 업종이다. 즉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롤마킹(원산지·제조사 표기) 위·변조, KS 미인증, 품질검사 성적서 위조 제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철강재가 유입돼 무차별적으로 시공되면서, 이를 솎아내기 위해 건설업계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안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한 중견 건설사에서 자재 구매와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A 과장. 근래 발생한 세종시 철근 부실 시공 아파트, 천안 아산 기울어진 오피스텔 등 사건으로 인해 현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을 주(主)사업군으로 하고 있어, 부실 시공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 과장은 “근래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철근, 기초 파일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철강재가 설계 대비 30~40% 적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공종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들이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등 수입산의 국내 철강재 시장 점유율이 40%를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설현장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부적합 철강재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에도 들어갔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산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KS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현장서 무분별하게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그는 “한창 철근 수요가 많았던 2000년대 중반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보도되면서 중국산은 국내서 잠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최근 다시 중국산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철강재에 대한 검수 작업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짝퉁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요구와 잇따르는 실정이다.
실례로 건설현장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철근은 SD400 강종으로, 수입산 유입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강도를 좀더 높인 SD500, SD600 등 강종은 수입산을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SD500·SD600의 t당 단가는 (SD400 대비) 비싼 편이지만 단위 면적에 투입되는 철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공기 단축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형사에서 철강재 구매를 담당하는 B 차장은 “LH가 2011년 설계한 아파트 등 주택사업부터 SD500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관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짝퉁의 우려도 없는 편이어서 사용을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고부가가치 철강재의 대중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철강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철근 수요는 881만t(7대 제강사 기준)이다. 그러나 SD500·SD600의 수요는 총 100만t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기술영업팀이 중심이 돼 건설사를 대상으로 초고장력 철강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늘려가고 있지만, t당 단가가 비싸다는 점 등에 대해 많은 건설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군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원가 절감 등의 측면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
출처 : 건설경제(http://www.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