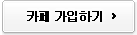관련판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 등의 청구에 대한 사례 |
|
|---|---|
| 글쓴이 이승환 2007.11.15 00:00 | 조회수 2836 0 스크랩 0 |
|
~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 등의 청구에 대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한정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균등판단에 의한 침해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한 사례 ~
(A Case denied infringement both under the Restricted Interpretation and the Doctrine of Equivalent by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사건,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평성18년(ネ) 제10052호, 평성19ㆍ3ㆍ27 제4부 판결, 판례집 미등재,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사건, 동경지재(東京地裁) 평성17년(ワ) 제14066호, 평성18ㆍ4ㆍ26 민사 제29부 판결, 판례 시보 1947호 88항, 판례 Times 1230호 282항)
초록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의해 균등침해가 부정된 본 판결은, 청구항 해석에서 출원경과에 대한 역할과 함께, 독일형 균등판례를 나타내 보였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보여준 균등 5 요건의 재고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실
X1(원고ㆍ공소인)은, 건조장치에 관한 특허권(본건 특허권 1), 회전날개를 가지는 건조장치에 관한 특허권(본건 특허권 2), 건조물의 건조방법에 관한 특허권(본권 특허권 3)의 특허권자이고, X2(원고ㆍ공소인)는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이다. Y(피고ㆍ피공소인)은, 건조장치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X는(X1, X2 포함), Y 제품이 본건 특허권 1 및 2의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또한 본권 특허권 3의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의 사용에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금지, 동 제품의 폐기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본건 각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 건조장치의 건조통 내에, 「여러 장(복수매)」의 기본날개를 배치ㆍ설계하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바, Y는, 이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경과로부터, 「건조통 밑바닥의 최하부에 복수매(複數枚)」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X 등은, 동(同) 주장을 부당하다고 하여, 가령 Y의 주장을 인정하여, Y 제품이 본건 각 특허권의 청구의 범위에 있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Y 제품은 각 구성요건과 균등하고, 본건 각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동경지판(東京地判) 평성18년 4월26일)은, 본건 각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로부터 본건 각 발명의 작용효과를 분명하게 한 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인 「여러 장(복수매)」의 의미를 Y의 주장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균등침해에 관해서도 이를 부정하여 X의 청구를 기각했다. X는 이를 불복하여 공소했다.
판지(判旨) 공소기각
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서
(1) 원심인용부분
「상기와 같이, 본건 명세서 1에는, 종래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과제③ 「상기 피건조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한 장의 수직 나선 회전날개에 의해 상승시킨다. 이 때문에, 상기 건조통 내의 밑바닥(저부)에 위치하는 피건조물의 전체 양에 비해 상승하는 피건조물의 양이 적고, 조기에 피건조물을 전열(伝熱)면에 접촉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밑바닥에 피건조물이 쌓인 상태가 계속되기 쉽고, 건조효율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웠다.」을 예를 들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본건 발명 A(본건 특허권 1의 청구항 1에 관련되는 발명.)의 작용효과로서 작용효과③ 「상기 여러 장의 기본날개로부터, 상기 건조통 안의 밑바닥에 있는 피건조물을 여러 장의 각각의 기본날개로부터 위로 감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기 건조통 내의 저부(底部)에 위치하는 피건조물의 전체 양에 비해 상승하는 피건조물의 양이 많아, 조기에 피건조물을 전열면에 접촉시키기 쉽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들은, 그 내용을 대비하면 분명하듯이, 본건 발명 A가 과제③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작용효과③을 가진다는 사실을 바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제③ 중에 「단지 한 장의 수직 나선 회전날개에 의해 상승시킨다. 이 때문에, ㆍㆍㆍ」, 「건조통 내의 저부에 위치하는 피건조물의 전체 양에 비해」라는 기재로부터, 과제③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건조통의 밑바닥에 쌓인 피건조물을 상승시키는 최하단의 날개가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과제③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먼저 최하단의 날개를 여러 장으로 하는 구성을 채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ㆍㆍㆍ 그리고 본건 명세서 1의 [0016] (작용효과③)에 있어서, 본건 발명 A의 건조장치에 관해, 「건조통 4 안의 저부에 위치한 피건조물 3을, 여러 장의 기본날개 5A 각각으로 위로 감아 올려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기 건조통 4 안의 밑바닥에 위치한 피건조물 3의 전체 양에 비해 상승하는 피건조물 3의 양이 많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본건 발명 A의 장치가, 건조통 내 밑바닥의 피건조물을 여러 장의 기본날개 5A에 의해 복수개소에서 위로 감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한편으로, 본건 발명 A의 기술적 범위에, 최하단에 한 장밖에 날개를 가지지 않는 장치가 포함되어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기재는 없다. 또한, 본건 명세서 1중에는, 본건 발명 A로서, 종래기술의 한 장의 수직 나선 회전날개를 도중에서 절단해서 여러 장(복수매)으로 구성한 건조장치의 개시(開示)는 없고, 실시예에서도, 개시되어있는 것은 모두 최하단에 여러 장의 기본날개가 배치ㆍ설계된 건조장치뿐이고, 최하단에 한 장밖에 날개를 가지지 않는 장치는 과제③을 가지는 종래기술로서 기재되어있다. 그렇다면, 본건 발명 A의 기술적 범위로부터는, 최하단에 한 장밖에 날개를 가지지 않는 장치가 제외되어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 본건 명세서 1의 기재로부터, 과제③의 해결책으로서, 객관적, 기술적으로 밑바닥 부분(底部)의 날개를 여러 장으로 하는 구성이 불가결한지 아닌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본건 발명 A에서는, 과제③의 해결책으로서, 밑바닥 부분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이 채용되어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발명 A의 구성요건 A1의 「복수매」는, 최하단에 복수매의 기본날개가 배치되어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부가(附加)부분
「그리고 당초 명세서 A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 기재의 발명 및 청구항 2 기재의 발명에 대해서, 상기 구성 및 실시예 등이 기재되어있고, 건조통 저부(底部)의 최하단의 기본날개가 복수매(複數枚)가 아니라는 사실이 엿보이는 발명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본건 발명 A의 특허청구범위(본건 특허권 1에 관련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는, 상기 당초 명세서 A의 기재범위 내에서 보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당초 명세서 A에 기재된 발명이, 건조통 저부의 최하단에 복수매의 기본날개가 배치ㆍ설계된 것 이외(以外)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본건 발명 A에서, 건조통 저부의 최하단에 배치ㆍ설계되는 기본날개가, 여러 장이던지, 한 장이던지 괜찮은 것으로서, 보정이 허용될 리는 없고(평성6년 법률 제116호에 의한 개정전의 특허법 17조 이하), 본건 발명 A의 건조통 저부의 최하단에 배치ㆍ설계되는 기본날개는 복수매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본건 특허권 1의 특허사정 및 등록이 행해진 것은 명백하다.」
(3) 공소심에 있어서 부가된 주장에 대해서
「공소인들은, ㆍㆍㆍ 본건 발명 A~C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법 70조1항에 근거해, 본건 특허권 1~3에 관련되는 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되어있는 뜻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고, 함부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법 70조2항(평성14년 법률 제24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은, 「전항(前項)의 경우에서는, 원서에 첨부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본건 각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매」라는 용어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한가지 뜻으로만(一義的으로)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ㆍㆍㆍ.」
2. 균등판단에 대해서
(1) 원심인용부분
「지금까지의 검토에 의하면, 본건 각 발명과 피고제품 및 피고방법과의 서로 다른 부분인 「최하단에 복수매의 기본날개를 배치ㆍ설계한」이라는 구성(방법)이,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피고장치 및 피고방법이, 본건 각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다고는 할 수 없다. ㆍㆍㆍ 즉,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중,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ㆍㆍㆍ, 본건 각 발명은, 피건조물을 나선형태로 상승시킬 때의 시작(점)이 일개소(一箇所)였기 때문에 과제③이 발생했다고 하는 인식을 근거로, 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하부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을 채용하여, 작용효과③을 가지면서, 동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최하부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은, 정확히 본건 각 발명에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ㆍㆍㆍ 이에 대해, 원고 등은,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기본날개에 대해서, 「평면으로부터 보아 360도의 원주범위 내」라는 것과, 「복수매」라는 사실로부터, 과제③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하부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지 않더라도, 최하부의 날개를 다른 날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함으로써(각도를 360도 범위 내에서 크게 하면), 건조통 내 저부에 위치하는 피건조물의 전체 양에 비해 상승하는 피건조물의 양을 많게 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과제③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최하단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 이외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ㆍㆍㆍ, 본건 각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각 발명에서는, 과제③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하부의 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을 채용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구성을 채용한 것이, 확실히 본건 각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고 등은,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기본날개에 대해서 「평면으로부터 보아 360도의 원주범위 내」라는 것과, 「복수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질적 부분이 과제③의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본건 각 명세서의 기재로부터는 불분명하고, 최하부의 날개를 다른 날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하는 구성은, 본건 각 명세서에서, 실시예로서 개시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사도 되어있지 않아, 본건 각 발명에서 있어서, 과제③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와 같은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ㆍㆍㆍ 이상에 의하면, 최하부에 복수매의 기본날개를 배치설계하는 부분은,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피고장치 및 피고방법이, 본건 각 발명과 균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균등에 대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부가부분
「균등의 요건에 관련되는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중,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을 말하는바, 본건 각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본건 각 발명은, 과제③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최하부의 날개를 복 것이, 본건 각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ㆍㆍㆍ.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란, 당해 특허발명에 관련되는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본 경우에, 상기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최하단의 기본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이 유일한 것인지 어떤지, 혹은 최하단의 기본날개를 복수매로 하는 구성이, 다른 기술수단과 비교해, 우수한 것이진 어떤지는 다른 견해이다. 따라서, 피공소인장치와 본건 각 발명의 실시예의 하나를 각각 현실로 이동시킨 다음, 양자(兩者)에 있어서의 피건조물의 실제거동이나, 건조효과 등을 비교하여, 그것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공소인장치에 있어서의 구성 내지 이것과 근사한 구성이,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듯한 주장은, 역으로, 양자에 있어서의 피건조물의 실제거동이나, 건조효과 등에 관련되는 부분의 주장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평석(評釋)
1. 본 판결의 위치설정
본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이하, 관용에 따라 청구항이라 함)의 해석시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로부터, 청구항의 기재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동 해석을 균등침해의 유무의 검토에 대해서도 이용한 것이다. 최고재 평성10년 2월24일 판결 [無限摺動用 볼스프라인 軸受사건] 民集 52권1호113항, 判時1630호32항, 判タ969호105항.
이 균등론의 요건을 보였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의론(議論)은 균등론의 시비가 아니라, 동 판결이 나타내 보인 요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로 옮겨졌다. 遠藤誠 「ボールスプライン사건 최고재판결 이후의 균등론의 적용」 判タ1051호60항, 특허제2위원회 제1소위원회 「균등5요건에 관한 논점의 분석과 유의점 (1~2)」 知財管理 51권8호1239항, 同卷 9호1403항 참조
이 학설에 대한 의론의 불거져 나온 것과는 달리, 균등론에 의한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은 적고, 이것을 부정하는 판례는 최고재판소가 나타내 보인 5개의 요건 모두를 검토하지 않고, 대다수는 제1요건의 검토에 의해서만 그 결론이 나타났다. 평성9년부터 평성14년까지의 판례에 있어서 균등5요건 각각의 검토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지적재산 연구소 편 『평성14년도 조사연구 특허 청구항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II)』 (지적재산연구소, 2003) 자료 (http://www.iip.or.jp/summary/equivalent.html)가 있다.
본건도 원심, 본 판결과 함께, 제1요건을 검토하여,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균등침해를 부정했다.
최고재판소가 보인 균등요건의 내용, 적용순서 등에 대해서는, 동 판결에 대한 조사관해설 三村量一 「조사관해설」 최고재판소판례해설민사편 평성10년도 (상) 112항.
이 일정한 해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판례 실무는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되어있다. 본 판결은, 지적재산 사건에 대한 재판의 한층 실무 및 신속화를 목적으로 평성17년에 설치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설치법(평성16년 6월18일 법률 제119호, 평성17년 4월1일 시행). 입법의 경위에 대해서는, 近藤昌昭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설치법(평성16년 법률 제119호)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16년 법률 제120호)에 대해서」 지적 프리즘 제2권24호 (2004) 1항 참조.
가, 균등론에 대해 동일한 판례 실무를 채용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최고재판소기준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항에서의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과 침해판단
피의(被疑)침해제품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어떤지의 판단은, 먼저, 청구항의 파악을 위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해석하고, 그 후, 해석된 청구항 범위와 피의침해제품 등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행한다.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을 위해서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고려한 다음, 청구항 용어를 해석하여 행하여 지는 것은, 본 판결이 나타내 보인 것과 같다. 이것은 법70조2항에 정해진 바에 의한 것이지만, 동항은 최판(最判) 평성3년 3월8일 [리파아제 사건] 民集 45권3호123항, 判時1380호131항, 判タ754호141항.
에 의해 발생한 혼란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평성6년 개정 평성6년 12월14일 법률 제116호, 평성7년 7월1일 시행.
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상세한 것은, 공업소유권 심의회 『특허법 등의 개정에 관한 답신』 (평성6년 9월7일) 30-31항 참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기재에 덧붙여, 출원경과도 청구항 해석을 위해서 참작하는 것이 허용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구항이 그 자체로 불명료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다. 예를 들면, 東京高判 昭和44년 5월26일 無体裁集 1권108항, 東京地判 昭和51년 7월21일 判タ352호313항 [나리직스酸 사건] 참조.
이와 같이 해석된 특허권과 피의침해제품 등과의 비교는, 구성요건설로 불리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이 구성요건설은, 판례에 의하면, 「청구범위를 편의(便宜)적인 어구를 따라 다수요건으로 분할한 다음, 이것과 대응하는 당해 구체적인 방법의 특징을 낱낱이 상세하게 대비하여, 양자가 과부족이 아니면서, 완전히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의해 속(屬)하는지의 여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필자주)]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으로 되어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 우요건(右要件)을 충족할 때, 비로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가 있다. 東京地判 昭和51년 5월26일 판례공업소유권법 [현행법 편] 2305의 137의 722항, 724-725항.
」라고 설명된다. 이때, 각 구성요소의 특정은, 청구항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것에 의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사상이 무엇인가에 의해 행하여졌다. 東京地判 昭和41년 11월22일 下民集 17권 1112호1116항, 1131-1132항 참조.
현재의 구성요건설은, 청구항을 편의적인 어구를 따라 다수분할한다는 방식을 답습(踏襲)하고 있고, 또한 각 요건의 의의(意義)에 관해서는, 본 판결과 같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발명의 작용효과의 특정으로부터 기술사상을 확정하고 있다. 확정된 각 구성요건은 피의침해대상을 마찬가지로 구성마다 분류한 것과 대비되고, 발명의 구성요건 전부를 충족하는지 어떤지가 판단된다.
특허권침해는, 이와 같이, 피의침해제품 등이 청구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침해자가 청구항의 문언(文言)을 사소한 변경에 의해 벗어날 수가 있게 되면, 장래의 온갖 침해형태를 예상할 수 없는 특허권자와의 관계에서 평형의 이념에 어긋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문헌상은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로 해석한다고 하는, 소위 균등론의 5 요건이 최고재판소에 의해 명시된 것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에 대상제품 등과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1) 우부분(右部分)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2) 우부분(右部分)을 대상제품 등에 있는 것과 치환해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3) 우(右)와 같이 치환함으로써,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이하, 「당업자」라 함)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하여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4)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의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지금부터 우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推考)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5)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수속에 있어서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特段)의 사정도 없을 때는, 우(右)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걸맞다. 民集, 前揭注1, 117항.
」라는 것이다.
3. 균등론 다섯 개 요건의 성질
(1) 제1요건과 제2요건 이하의 관계
본 판결에서는, 상기의 5요건 중, 제1요건의 판단에 의해, 균등침해가 부정되고 있다.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에 대상제품 등과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1) 우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라는 요건의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고 되어있다. 하나는, 청구항의 구성요건과 피의침해대상과의 서로 다른 부분이 특허발명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설이고, 판지를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이해가 된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으로, 渋谷達紀 「지적재산법 관계의 최고재판례」 牧野利秋 판사퇴관기념 『지적재산법과 현재사회』 (信山社, 1999년) 222항, 本間崇 「최고재판결 (無限摺動用 ボールスプライン 軸受 사건)으로부터 본 21세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일본) 특허권의 권리범위의 해석동향」 지재관리 48권11호1802항 주(9), 辰巳直彦 「判批」 민상 119권6호124항, 吉田一彦 「判批」 NBL676호62항, 大瀬戸豪志 「등가이론의 기초」 지적재산 연구소 편 『21세기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전망』 107항, 111항, 小谷悅司 「균등론의 동향」 Patent 53권9호7항, 布井要太郞 「判批」 判タ1015호52항, 村林隆一=松本司=岩坪哲 『신특허침해소송의 실무』 131항, 松本重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신판]』 381항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부분을 포함한 피의침해대상이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설로, 조사관해설은 이것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조사관해설(三村, 前揭注 4, 141항), 牧野利秋 「균등론의 적용요건」 특허연구 26호38항 (1998년), 동 「특허연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淸永利亮=設樂隆一 편저 『현대판례법 대계 26』 (신일본법규, 1999년) 93항, 設樂隆一 「ボールスプライン사건 최고재판결의 균등론과 금후의 諸과제」 牧野利秋 판사퇴관기념 『지적재산법과 현대사회』 303항 등이 있다.
본 판결은, Y 제품과 X 특허와 비교에 있어, 건조통 내에 「복수」의 기본날개를 배치ㆍ설계한다고 하는 부분을 발명의 과제와 작용효과로부터 「최하단에 복수매의 기본날개를 배치ㆍ설계한」으로 해석한 다음, 동 부분이 「본건 각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피고장치 및 피고방법이, 본건 박 발명과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본 판결이 제1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균등침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 판결은, 제1요건에 대해서, 조사관해설과 동일해석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본 판결은, 발명의 작용효과를 발명의 과제와의 관계에서 제1요건으로서 검토하고 있지만, 대체로 치환해도 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가져올지 어떨지는 제2요건에 부여된 기능이기도 하다. 조사관해설은, 최고재 판결이 제1요건에 종래 사용되어 진 「기술사상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기술사상의 동일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균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고, 균등의 요건으로서 기술사상의 동일성을 드는 것은 Tautology(동의ㆍ반복)가 된다. 大橋寬明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균등론」 牧野利秋 편 『재판실무대계 9권 (공업소유권소송법)』 (靑林書院, 1985년) 177항.
」는 취지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한다. 三村, 前揭注 4, 142항 참조.
그러나 본 판결과 같은 판결은, 확실히, 현실에서는, 조사관해설이 말하는 Tautology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 판결은, 제1요건의 판결만으로 균등침해를 부정하고 있고, 제2요건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판단은, 제1요건에서의 발판단 즉 균등판단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명의 본질적 부분의 해석으로부터 청구항 범위의 확장해석(이것을 균등론으로 부른 것도 많다.)을 행하는 판단방법은, 독일의 전통적 확장해석에 연결되는 것이다. 大友信秀 「균등론의 법적성질」 일본공업소유권법학회 연보 29호 (2005) 5항 이하 참조.
이것에 대해서, 제2요건 및 제3요건은, 제3요건이 침해시 기준을 채용한 것에도 나타내고 있듯이, 미국형의 균등판단방법이다. 同上, 2항 이하 참조.
대체로, 제1요건이 도입된 것은, 「치환가능성 및 용이상도(想到)성 만을 요건으로 그 판단의 기준시를 침해시로 할 때는, 균등이 성립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지만,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은 대상제품 등은, 당해 특허발명과 기술사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三村, 前揭注 4, 142항 참조.
」는 때문이라고 조사관해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균등론의 제2요건 및 제3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항 해석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에 따라, 청구항을 가능한 한 형식적으로 이용해서 피의침해대상과의 비교를 행하는 작업임에 대해서, 제1요건은, 청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 요건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요건 및 제2, 제3요건의 관계를 조사관해설과 같이 생각하면, 제2, 제3요건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는 다 보충할 수 없는 균등판단을 제1요건이라고 하는 실질적 판단을 행하는 요건으로부터 담보(擔保)하는 것이 되지만, 실질적 판단을 행하는 요건이 한 개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에 의지해, 다른 요건의 검토를 거치는 일 없이 침해판단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조사관해설에 의하면, 균등판단은, 제2요건, 제1요건의 순으로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동상, 142-143항.
, 최고재 판결 이후의 하급심(下級審)의 대부분은, 제1요건을 처음부터 적용하여,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요건 이하의 판단을 행하지 않고 균등을 부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연구소, 前揭注 3 참조. 또한, 평성14년 7월18일부터 17년 12월28일 사이에 내려진 98건의 균등론이 문제가 된 판결 중, 제1요건을 판단하여 침해를 부정한 것은 57건에 이르고, 이 중 제1요건에 의해서만 침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30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의 균등 5요건이 전체적으로 보아 통일적으로 이용 가능한 성질의 것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2) 제5요건 (審査經過 禁反言)의 성질
본 판결에서는, 청구항의 문언 해석에 있어, 출원경과도 참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명확하게 된 청구항 내용으로부터, 균등론의 제1요건 충족성이 부정되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항의 제한해석의 근거가 출원경과만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내 보인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원경과에 의한 제한장면의 전형적인 예로서 논할 수는 없지만, 출원경과가 청구항 해석과 균등론의 양장면에서 기능(機能)을 할 수 있는 일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점, 출원경과가 청구항 해석의 장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드물게 금반언(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균등론의 제한으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심사경과 금반언 혹은 포대 금반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신의(信義) 측의 한 형태로 하는 것이 일본에의 다수설이다. 高林龍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신의 측ㆍ권리의 남용」 曹時 53권3호19항, 愛知靖之 「심사경과 금반언의 이론적 근거와 판단의 틀 (一)」 법학론 155권6호18항 (2004) 참조.
그러나 원래 심사경과 금반언을 균등론의 제한으로 가지는 미국은, 출원경과를 청구항 자신이나 명세서와 동등의 청구항 해석자료로서 취급하고 있고, 그 내용의 파악은, 객관적 기술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포대 금반언(연방순회구 상소재판소에 의해서 심사경과 금반언이라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은, Graver Tank 판결(Graver Tank Mfg. Co. v. Linde Air Prod. Co., 339 U.S. 605 (1950))을 계기로 평형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 후, 균등론이 평형법적 성질을 잃음과 동시에, 객관적 기술범위에 관한 것으로서의 위치설정을 가지는데에 이르렀다(See e.go.,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2002)).
이것에 대해, 심사경과 금반언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는 독일은, 기술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출원인이 심사수속 중에 행한 행위로부터 균등범위를 제한하는 명백한 제한 및 포기라고 하는 법리(法理)를 가진다. 독일는, 출원경과의 참작을 판례상 금지하여 왔기 때문에, 대체로 심사경과 금반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전제를 가지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大友, 前揭注 17 참조.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출원결과의 이용기법은, 객관적 기술범위를 정하기 위해 출원경과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온 독일 특유의 것이다. 출원경과에 객관적으로, 게다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독일의 명백한 제한 및 포기라고 하는 법리는, 일본의 신의 측을 근거로 하는 심사경과 금반언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미국과는 달리 기술과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참고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판결이 나타내고 있듯이, 출원경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용이 금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大友, 前揭注 17, 25항, 注90 (미국과 동일 영미법국으로 위치설정된 영국에서는 심사경과 금반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국이 명문(明文)으로 특허범위의 판단에서의 심사경과의 참작을 금지하여온 것에 있다. (1833년 법9조5항, 1907년 법68조 참조) 참조.
,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고, 동일내용이 균등판단의 장면에서의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출원경과의 작용을 신의 측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를 불명확한 것으로 할 위험이 있다. 단적(端的)으로, 미국과 같이 객관적인 기술판단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위치설정 하던지, 독일과 같이, 기술과는 관계없이, 공개된 자료에 출원인의 주관이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고려한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에 출원경과의 참작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고, 왜, 마찬가지로 공개되어, 특허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있는 청구항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판결에서의 균등판단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전통적 확장해석의 기법과 유사한 구조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최고재가 나타내 보인 균등요건 중, 미국형을 도입한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제1요건을 보다 치밀하게 함으로서 균등판단을 행하는 것도, 독일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요건이 침해시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점은, 독일의 전통적 해석방법으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고, 동(同) 요건을 유지한 채, 제1요건과 병존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파탄(破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심사경과 금반언에 대해서도, 판례ㆍ학설의 위치설정이 불명확한 채로는, 균등론의 전체성질에 대한 이해도 크게 저해한다. 대상들끼리의 비교에 의한 미국형 균등론과 청구항의 해석을 기초로 하는 독일의 전통적 확장해석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채용하는 확장해석의 방법을 법적성질론(法的性質論)으로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
|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2010다26769 판결[손해배상] |
|---|---|
| 다음글 |
외국에서의 선사용권제도에 대해서 |